- 내란재판부 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
- ‘계엄연루’ 추경호 첫재판…특검 “국민관심 커 신속재판해야”
- 위성락 “’핵잠’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…美실무단 내년초 방한”
- ‘평양무인기’ 김용현·여인형 추가 구속…법원 “증거인멸 염려”
- “트럼프 정부, 망명신청자 8천명 과테말라 등 제3국 추방 추진”
- 잇단 트럼프 때리기에도…파월, 지지율 3부 요인중 최고
close
- 탁 트인 전망과 불꽃놀이로 즐기는 PALMS CASINO RESORT의 올인클루시브 2026 새해 맞이
- 워너브러더스 주주 “파라마운트 인수안 여전히 불충분”
- 美 경제 3분기 4.3% ‘깜짝 성장’…강한 소비가 성장견인
- 1,480원까지 돌파한 환율… “내년에도 고공 행진”
- 공정위,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명령
- 올해 AI로 전국 일자리 5만5,000개 증발
close
- 양민혁·배준호 등 병역특례 기대감 커졌다, 日 자국 아시안게임도 ‘U-21’ 참가
- 송성문, 메디컬테스트에 초긴장 “혹시 뭐 나올까 걱정했다→미국 열심히 갔는데 맨손으로 돌아올까봐”
- 손흥민, 3년 연속 ‘KFA 올해의 골’… 볼리비아전 프리킥 득점
- 송성문, 샌디에고 입단 공식 발표… 4년 계약
- 뉴욕, 마이애미 격파… 브런슨 괴력의 47점
- ‘마침내’ SD 송성문 초대박! ‘3+1+1년 2100만$’ 잭폿 터졌다... 특별한 인센티브 계약까지 공개
close
- “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비결”… ‘이것’ 많이 할수록 노화 2배 늦춘다
- 한국에는 사방에 널린 ‘이것’… 몸값 ‘쑥’ 올라 고급 재료로 쓰인다는데, 효능은?
-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5회
- 생면, 치즈, 후추로만 만들어도 맛있다… 편안한 음식의 특별한 맛
- “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”… ‘이것’ 넣으면 1급 발암물질
- 겨울 되니 ‘이 바이러스’ 돌아왔다… “변기 뚜껑 닫고 물 내려야”
close
- 고등학교 성적 인플레… SAT 점수 중요성 다시 부각
- ‘얼리 디시전’ 합격 후 포기?… 불이익 따를 수도
- WINTER HOLIDAYS, 2025
- 조기전형 결과가 인생 결정하지 않는다
- 여름 방학 계획 미리 살펴보기
- 명품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의 역설계
close
- [건강포커스] “모든 니코틴은 심혈관 독소…청소년 중독 방지 대책 시급”
- 잃어버린 피부감각 되찾아준다… 유방재건, 의외의 효과
- 가족 얼굴 못 알아보고 성격 변한 부모님… “서양 기준으론 정상?”
- “수십년 된 약물이 알츠하이머병 뇌세포 사멸·인지 저하 완화”
- [건강포커스] “밤에 더 자주 깨는 어르신, 다음 날 인지수행 능력 떨어져”
- 황반변성=노인병? 아니었다… 2030 시력 위협하는 뜻밖의 원인
close
- 5세 소녀를 구조하려는 요원들의 사투
- 세일즈 걸들의 무료한 삶을 차가우면서도 동정하고 이해
- 열대·사막·극지… 희귀 동식물 있는 ‘작은 지구’ 서천 생태원
- 세렝게티에서 맞닥뜨린 버팔로 구출작전… 온몸에 전율
- [주말 뭐 볼까 OTT] 세 번째 수수께끼, 신앙의 무게 짊어진 고딕 미스터리의 귀환
- 다시 돌아온 주토피아… 차이를 넘어선 우정의 진화
close
- 거래 더디지만 균형 회복… 리얼터닷컴 내년 주택시장 전망
- 5년 규칙은 옛말… 집 사고 10년은 보유해야 본전
- 2026년 미국 주택 시장의 동향
- 2026년 미국 부동산 NAR 전망
- “리모델링하면 집값 오르겠지?”… 지나치면 ‘역효과’
- 주택보험료, 2027년까지 16% 인상 전망… 주거비 압박 심화
close
- 해외서도 극과극 반응’대홍수’, 넷플릭스 글로벌 1위 차지”SF 걸작 vs 최악”
- 이하늬, 기획사 미등록 혐의 검찰 송치.. “10월 정식 등록”
- ‘마약 혐의’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경찰에 체포
- ‘트롯돌’ 손태진, 오디션 우승상금 7~8억?.. “무서워서 1년 넘게 안 썼다”
- ‘차량 링거’ 전현무 의료법 위반 고발당해… “적법한 진료” 해명
- 임윤아, 여우 주연상 쾌거.. “멋진 상 감사합니다”
close
정숙희의 시선온라인쇼핑과 반품, 그리고 그 이후
자카리아 칼럼트럼프의 새 독트린 “미국을 다시 왜소하게”
기타[미국은 지금] MAGA의 분열, 예견된 균열의 시작
기타[수요 에세이] 삶이라는 배를 타고
기타[지평선] ‘인간GPT’ 환각의 부작용
칼럼
기고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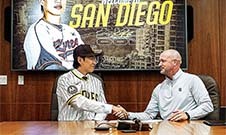












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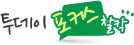














.png)

